복장에 대한 제약이 적어진 요즘과 달리, 과거의 회사에서는 정장을 입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회사원=정장이라는 공식이 널리 퍼져 있던 것이죠. 학생들이 교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정장은 회사원이라면 꼭 갖춰 입어야 하는 복장이었어요. 첫 출근을 앞둔 사회초년생들이 회사에 입고 다닐 정장을 맞추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정장을 판매하는 매장을 방문하는 풍경은 미디어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사원들은 정장을 입고 일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정장은 언제부터 회사원의 일상에 스며든 것일까요?

우리가 ‘정장’을 생각하면 흔히 떠올리게 되는 복장, 멀끔한 재킷에 슬랙스, 흰 와이셔츠와 단정한 넥타이는 잉글랜드 전통의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장은 ‘양복 정장’이라고 불려야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장은 사실 격식을 갖춘 모든 복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양복 정장을 ‘정장’이라고 간소하게 표현하겠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주류를 차지하던 정장 스타일은 셔츠, 바지, 조끼, 재킷, 넥타이, 구두, 모자, 코트, 지팡이를 모두 갖춘 것이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미국 스타일의 정장이 주류가 되면서, 셔츠, 바지, 재킷, 넥타이, 구두 정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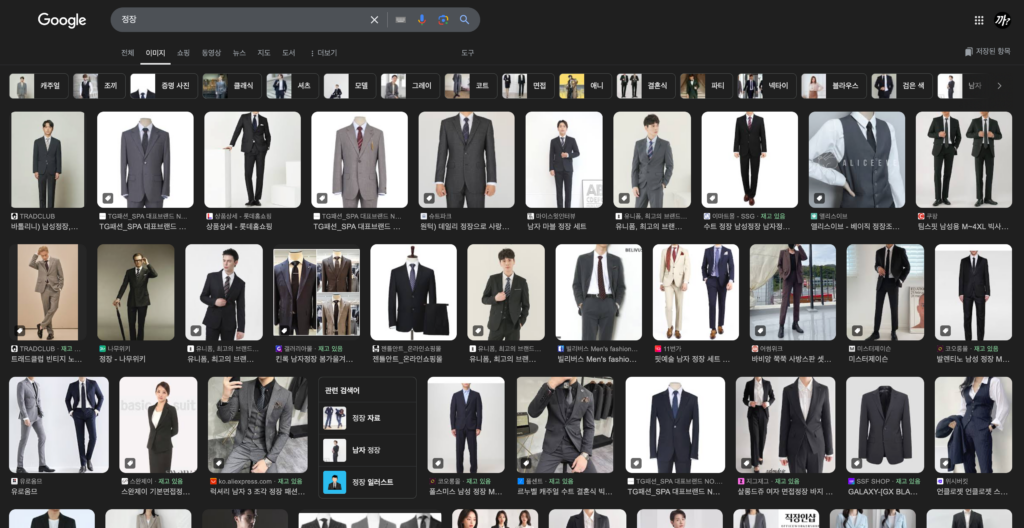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정장을 입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양복을 입은 사람은 구한말 개화파 정치가 서광범이었어요.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에 의해 양복을 입게 된 서광범을 시작으로 김옥균, 유길준, 홍영식, 윤치호 등이 양복을 구입했죠. 당시의 이들이 구입한 양복은 라펠이 작고, 앞 단추가 3-4개 정도 달려 있는 ‘섹코트’였습니다. 이후 프록코트를 입는 사람이 많아졌고, 1920년대에 들어서는 오늘날 콤비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세퍼레이트’가 많이 팔렸죠. 일제가 물러난 후, 미국의 ‘박스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거치며, 정장은 사회생활을 할 때 격식을 차리는 옷차림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사회생활의 주요 장소인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격식을 차리기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정장의 기존 공식을 벗어나, ‘노타이’ 패션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 인기를 얻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정장, 정장과 유사한 옷차림은 특히 회사원들에게 권해졌는데요, 요즘에는 정장과는 아예 동떨어진, 캐주얼 룩을 허용하는 회사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장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즈음의 회사 중 정장을 고집하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영업직 등, 손님을 맞아야 하는 직군이 아니라면요. 이러한 현상에는 회사원들의 선호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조사 결과, 자유복으로 출근하는 사람의 업무 만족도가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의 업무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장은 상당히 착용감이 불편한 옷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착용감이 더욱 편한 다른 옷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장은 가격의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장을 입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지만, 정장의 가격은 캐주얼 룩의 몇 배에 달합니다.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의 정장은 몇백만원을 호가하기도 하니 말이죠. 그리고 정장의 비슷비슷한 모양새는 현대 사회에서 중시하는 개성을 드러내기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최근에는 정장을 입는 회사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정장은 여전히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복장입니다. 오늘은 격식을 차리려면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당연한 말들이 자리를 잡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번쯤 이러한 역사와 배경을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